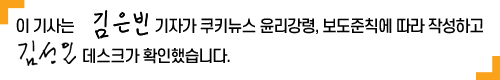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좀처럼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안을 내지 못하니, 우선 보험료부터 올려 연금 재정 곳간이 바닥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다만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로 보험료율 인상을 합의한 시민대표단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與 “보험료율부터 올리자”…소득대체율, 구조개혁과 병행 추진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 13% 인상을 먼저 처리하라”면서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연금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일단 보험료 납부액 비율만 9%에서 13%로 높이고, 나중에 소득대체율 조정과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자는 주장이다.
여당이 소득대체율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제안하는 이유가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정부안(42%), 여당안(43%), 야당안(45%)이 모두 상이한 상태라, 협상이 결렬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1.5%다. 소득대체율 조정이 연금제도의 틀을 뜯어고치는 구조개혁과 병행해 논의될 경우 연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5년 소득대체율은 41.5%로, 매년 0.5% 내려가 2028년 40%로 하향 조정되도록 설계됐다. 올해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내년엔 노후에 받을 수령액 감소도 불가피하다.
“연금 재정 위해 보험료부터 인상” vs “보장성 강화 않겠단 얘기”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분리 처리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렸다.
재정안정론 측은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당장 2년 뒤엔 국민연금 역사상 처음으로 연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헐게 되고, 2056년 기금 소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는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 인상부터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연금 보험료율 조정이 지연되면 연금 재정에 치명적이다. 올해 선거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 늦어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 소득 보장성 문제는 시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다”라며 “소득대체율 조정은 퇴직연금, 기초연금과의 다층체계 구조 속에서 함께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병행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보장론 측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따로 논의할 순 없다고 반발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리 처리는 말도 안 되는 방안”이라면서 “노사 교섭에서 근무 시간만 먼저 늘리고 임금 협상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화 결과 보험료율 인상에 국민들이 동의한 건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돈만 더 내라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보험료율 인상을 먼저하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나중에 하자는 것은 궤변”이라며 “따로 하자는 주장은 재정중심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료만 선제적으로 올려놓고, 소득대체율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자는 얘기는 결국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