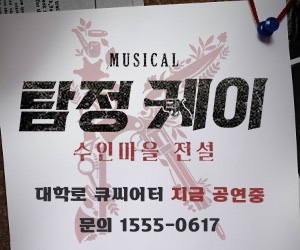쿠키뉴스 탐사보도팀의 ‘아이파일(I-File : Investigative reporting File)’은 독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거나 알았어도 지나쳤던 일주일 동안의 탐사보도를 풍부한 데이터와 자료, 증언을 더해 쉽고 흥미진진하게 전하는 코너입니다. 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증언이나 정보를 이곳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고려했습니다. 매 연재에는 취재기자의 후일담과 주관적인 시각도 집어넣었습니다. 독자들의 응원과 질책, 제보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병원 62병동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곳은 정신과 보호병동, 과거에는 폐쇄병동으로 불린 곳입니다. 여기선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의 격리 치료가 이뤄지죠.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90년대 중반 이곳에서 벌어진 네 개의 사건에 대한 겁니다. 지난 20여 년간 정신과 전문의들 사이에서 유령처럼 떠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얼개는 이렇습니다.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환자를 구타했다.’ 의사가 환자를 폭행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 199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 아이파일① : 두 발로 걸어라, 그럼 걷게 될지니
1995년 서울대병원 62병동에 30대 남성 A씨가 입원했습니다. 그는 사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져 병원에 온 것이었죠. 이 때문에 걸을 때마다 벽이나 난간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당시 약물 및 정신 치료 등이 이뤄졌지만 뚜렷한 호전은 없었습니다.
문제의 그날. 병동 회의가 끝나고 담당교수였던 ㅎ교수는 A환자를 병동에 있던 전공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찰칵. ㅎ교수는 문을 잠갔습니다. 이후 A씨의 머리를 손과 책 따위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걸으라면서 말이죠.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 3시간여의 ‘구타 치료’ 이후 A씨는 절룩이긴 했지만 스스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ㅎ교수의 ‘구타 치료’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제보자는 말합니다. “언제나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일은 반복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 아이파일② : 똑바로 말하라, 그럼 말하게 될지니
1996년 20대 여성 B씨가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말이 어눌하고 퇴행성 행동을 보이던 환자를 인터뷰 하던 ㅎ교수는 ‘말을 똑바로 하라.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앓던 병 때문에 환자는 ㅎ교수의 말대로 하질 못했습니다.
급기야 ㅎ교수는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타 치료’가 이어졌습니다. 환자는 허벅지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ㅎ교수는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힘껏 때렸습니다. 지시를 하고 환자가 따르지 못하면 다시 허벅지를 내리치는 식으로요.
환자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매질을 그만하라고 통사정을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할 때까지 맞아야 한다’면서 말이죠. A씨의 허벅지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증상의 원인은 딴 데 있었습니다. 정신과적 문제가 아니었단 것이 검사 결과로 나타나자, ㅎ교수는 의료진 십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어떤 환자 몸에 멍이 들었다고 하던데, 혹시 정신과에서 구타 사건이 있었냐고요. ㅎ교수의 위세에 눌린 사람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뜻을 거스르면 찍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의료인으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몹시 화가 납니다.”

◇ 아이파일③ : 내 뜻을 안 따르면 네 자식은 폐인이 될지니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ㅎ교수의 진료실. ㅎ교수는 씩씩거리며 서 있고, 마주앉은 환자와 보호자는 눈물을 줄줄 흘리는 기묘한 분위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신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입원도 시키고 급기야 굿까지 하면서 낫길 바랐지만, 상태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서울대병원에 내원했고 ㅎ교수를 만나게 된 것이죠. 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ㅎ교수는 보호자에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병원을 전전시키면서 환자를 망가뜨렸다고 말입니다.
의사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에 흥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ㅎ교수의 경우는 흥분의 정도가 매우 남달랐죠. 고함을 치다 급기야 집기들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나중엔 책상 서랍을 빼서 던지려고 했죠. 환자와 보호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보자들은 말합니다. “만성 정신질환 환자의 보호자는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교수로부터 보호자가 환자를 망쳤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커다란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 아이파일④ :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댈지어다
1998년 서울대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C씨는 종종 돌출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한번은 병실에서 모습을 감춰 병동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C씨는 곧 제 발로 돌아왔습니다. ㅎ교수는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찰싹, 찰싹. 병동에 다 들릴 정도로 힘껏 올려붙인 따귀 두 대.
곧 ㅎ교수는 또다시 의료진을 모아 놓고서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강변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잠자코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 하는 게 괴로웠지만 문제 삼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어요.”
ㅎ교수에게 뺨을 얻어맞은 이후 환자는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습니다. C씨가 앓던 정신장애는 정상인보다 심한 자괴감과 모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환자는 퇴원을 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 아이파일⑤ : ㅎ씨 혹은 H씨
쿠키뉴스 탐사보도팀은 <[단독] 서울대병원 폐쇄병동 폭력의 전말>, <[단독] 서울대병원 폐쇄병동 잔혹死… 女환자, 의사에게 그만 때리라 빌어> 등 2회에 걸쳐 ‘폐쇄병동 잔혹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단 90년대에 국한된 것이라고 우린 보지 않습니다.
‘ㅎ교수’ 혹은 ‘H교수’ 등 굳이 실명을 밝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선 그가 서울대병원 정신과의 실력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라서? 소송의 위험(?) 때문에. 굳이 이름을 ‘깔’ 필요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H 혹은 ㅎ’씨의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숱하게 보도를 했습니다(실명도 여러 번 공개했고 말이죠).
정신과 환자를 ’가가가가각’ 등으로 표현해 물의를 일으켰던 것(“강의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본 취지와 다르게 전달됐다”)이나 유력 정치권 인사의 아내를 본인 소속 병원에 ‘꽂으려’한 의혹(“복지부 공무원들이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지”), 최근의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몰아주기 의혹(그 많던 연구비는 누가 가져갔을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보도를 해왔는지 이젠 세기도 어렵습니다.
문제적 인사에 대한 서울대병원과 서울대학교는 ‘방조’와 ‘침묵’, 그리고 사실상 공조를 하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주관부처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 폐쇄병동 잔혹사 연속 보도는 방관자이길 거부한 의료진들의 용기에 바탕을 둡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기까지 걸린 20여년을 우린 당겨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얻어맞으며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해야 했던 한 여성 환자의 이야기를 보고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보건복지부, 교육부가 가만히 있다면, 당신들은 또 다른 ㅎ혹은 H씨와 다름없습니다.
※ 인용 보도 시 <쿠키뉴스 탐사보도>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쿠키뉴스에 있습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