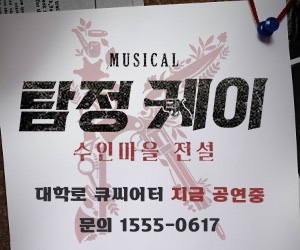왕궁 내부 구경을 마치고 났더니 11시다. 점심 전이기는 하지만 옛날 왕실 티룸이었다는 곳에서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드물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영국식 문화를 본토에서 경험해 본 셈이다. 이곳에서 경험한 애프터눈 티는 3단으로 된 접시에 설탕을 넉넉하게 바른 페이스트리, 몇 종류의 샌드위치, 그리고 다양한 스콘이 놓여 있었다.

애프터눈 티는 1840년경 7대 베드포드공작의 부인 안나 마리아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오후 8시에 시작되는 저녁을 기다리는 동안 배고픔을 달래려고 오후 3시 반과 5시 사이에 빵과 버터를 곁들여 차를 마시던 데서 시작했다. 부인은 손님이 왔을 때도 같이 양식의 가벼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후 상류사회로 애프터눈 티 문화가 퍼졌다. 19세기 말에는 중산층까지 확산됐다.
플로라 톰슨(Flora Thompson)이 1941년부터 1943년까지 나눠 발표한 3부작의 자전적 소설 ‘캔들포드로 날아간 종달새(Lark Rise to Candleford)’에서 잘 묘사되고 있다. 옥스포드셔(Oxfordshire)와 버킹엄셔(Buckinghamshire)의 시골마을에서도 “사람이 찾아오면 집주인은 차를 대접했다. 양옆에 분홍색 장미가 그려진 찻잔에 좋은 차를 담고, 얇은 빵에는 버터와 양상추를 얹었으며, 아침에 구운 바삭한 케익이 곁들여졌다”라고 나온다.
흔히 영국 상류사회 문화로 알려진 애프터눈 티는 영국에서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유럽대륙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떻든 영국의 상류사회에서 시작된 문화인만큼 애프터눈 티에 내놓는 다과의 종류나 먹는 방법에도 격식이 있다. 다과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빵과 케이크, 초콜릿 같은 디저트류로 구성하고, 얇게 썬 오이를 넣은 작은 샌드위치가 들어간다. 스콘은 20세기 들어 추가됐다고 한다. 3단으로 된 받침에 내온 다과 등은 맨 아래 있는 접시부터 먹으면 된다.
이른 점심시간이라서인지 차려내 온 다과를 남겨야 했지만, 티룸의 우아한 분위기만큼은 흠뻑 즐길 수 있었다. 애프터눈 티는 가까운 사람들과 차와 음식을 함께 하면서 교류하고 생활의 여유를 만끽하는 좋은 문화가 틀림없다. 짧은 여행이지만 함께 하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다.

애프터눈 티를 즐긴 다음에는 성곽의 보루에 올라 에든버러 구시가지의 모습을 두루 구경했다. 에든버러성은 구시가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해발 130m의 바위산, 캐슬락(Cast Rock)에 지어졌다. 캐슬락은 3억 5천만 년 전 카본기말에 분화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고, 주변의 퇴적암이 빙하의 활동으로 깎여나가 서북쪽에 80m의 절벽을 만들었다.
철기시대인 2세기 무렵부터 이 지역에 사람들이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1세 왕이 통치하던 12세기 무렵 왕실의 성이 있었고, 1633년까지는 왕궁으로 사용됐다. 17세기부터는 수비대가 주둔하는 군사적 요충지가 됐다.
에든버러성은 스코틀랜드왕국의 가장 중요한 요새였다. 따라서 14세기의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으로부터 1745년 자코바이트의 난(Jacobite rising)에 이르기까지 많은 전투가 치러졌다. 1100년의 역사 가운데 26건의 중요한 포위 공격 때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요새라고 알려졌다.
자코바이트의 난은 명예혁명으로 제임스 2세가 폐위된 사건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제임스 2세의 복위를 위해서 1688년부터 시작된 일련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나중에는 스튜어트왕조가 영국의 왕위를 되찾기 위해 봉기를 이어갔고, 1746년 찰스왕세자가 이끈 반란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1시경 글래스고(Glasgow)로 출발했다. 에든버러에서 글래스고까지는 버스로 한 시간 정도 걸린다. 글래스고에 사는 인구는 62만 명이며, 위성도시까지 포함하면 121만 명이 살고 있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영국 전체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이다.
글래스고는 오래 전 클라이드(Clyde)강가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됐다. 브리튼을 지배한 로마제국은 켈트족들과의 경계를 지키기 위해 안토니장벽(Antonine Wall)을 건설했다. 글래스고가 성장하게 된 것은 6세기 무렵 기독교 선교사인 먼고 성인(Saint Mungo)의 덕이다. 그가 지금의 글래스고 대성당이 있는 몰렌디나 번 (Molendinar Burn)에 교회를 세운 이후로 글래스고는 종교의 중심이 됐다.
글래스고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중기 게일어 혹은 그 이전의 컴브릭어로 녹색 분지, 혹은 녹색 계곡을 의미하는 글라스 카우(glas cau)라는 지명이 등장했다. 그 전에는 컴브릭어로 카트레스(Cathures)라고도 불렀다. 1116년 게일어로 글라스구(Glasgu)라는 지명이 나타나면서 오랫동안 사용돼 왔다. 글래스고 사람들은 글래스웨기안(Glaswegians) 혹은 위기스(Weegies)라고 칭한다.
15세기 무렵 글래스고대학교가 설립된 뒤로 18세기에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중심이 됐다. 18세기 이후로는 대서양 횡단무역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화학, 섬유 및 엔지니어링 분야를 선도했고, 특히 조선 및 해양엔지니어링산업에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2시 무렵 글래스고에 도착해서 중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서울을 떠난 지 벌써 나흘째이니 쌀밥을 먹고 원기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가 설명했다. 점심을 먹고 1시간 정도 켈빈그로브 미술관 및 박물관을 구경했다. 여행하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소장품을 감상하는 경우가 참 드문데 영국여행의 경우 꽤 많은 미술관 혹은 박물관에 들른 것도 특이했다.
이 건물은 1888년 켈빈그로브 공원에서 열린 국제전시회의 수익금으로 지었다. 존 W. 심슨(John W. Simpson) 과 에드 밀너 알렌(Ed Milner Allen)이 스페인풍의 바로크 양식으로 설계했다. 스코틀랜드의 로카브릭스(Locharbriggs)에서 나는 붉은 사암을 사용했다. 1901년 열린 글래스고 국제전시회의 일환으로 미술전을 열었다.
소장품들은 주로 맬렐란 갤러리(McLellan Galleries)와 켈빈그로브 하우스 박물관에서 왔다. 이곳에는 22개의 갤러리에 모두 8,000점이 소장돼 있다. 갑옷과 무기를 포함한 자연사 수집품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미술품으로는 렘브란트 판 레인(Rembrandt van Rijn), 게라르트 데 라이레세(Gerard de Lairesse), 요세프 이스라엘스(Jozef Israëls) 등 네덜란드 고전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 카미유 피사로(Camille Pissarro), 빈센트 반 고호(Vincent van Gogh) 등 프랑스 인상파 작품 이외에도 네덜란드 르네상스, 스코틀랜드 컬러리스트(Scottish Colourists)들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화가들의 이름은 아주 익숙한데 대부분 알려진 작품들은 그렇지 않다. 아마도 화가들의 초기작품들이 아닐까 싶다. 마티스의 ‘분홍색 테이블보’도 특유의 강렬한 느낌이 덜했고, 르누아르의 ‘정물’ 역시 세밀한 붓질을 느낄 수 없었다. 다만 렘브란트의 ‘알렉산더대왕으로 짐작되는 무장한 남자’는 어둠과 강한 빛이 대비되는 화가 특유의 화풍을 느낄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살바도르 달리의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Christ of Saint John of the Cross)’가 있다. 대가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1시간의 자유시간이 아쉽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배를 타고 벨파스트로 건너가야 하니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여행사마다 일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나 보다. 우리 일행은 켈빈그로브 미술관 및 박물관을 구경했는데, 심평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조석현 위원장은 이곳을 여행하면서 글래스고 현대미술관(Gallery of Modern Art)을 관람했다는 것이다. 이 미술관은 1778년 세워진 레인 쇼우의 윌리엄 커닝햄의 주택을 보수해 1996년에 개관했다.
전시물은 주로 지역 및 국제 예술가들의 현대미술작품을 전시한다. 2년마다 현대사회의 문제를 다룬 전시를 기획한다. 마침 전시하던 스위스 아티스트 듀오 페터 피슐리(Peter Fischli)와 다비드 바이스(David Weiss)의 1987년 작 ‘가는 길(Way Things Go)’이 인상적이었나 보다.
시인이기도 한 조 위원장은 작품을 감상한 소감을 ‘글라스고우 현대미술관-The Way Things G0, 1987’이라는 제목의 시에 담았다. “TV앞에 / 눈길을 멈춘다 // 한 치의 오차도 없이 /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들 // 행위의 공간이 / 평면에 담기고 / 그 평면에 공간을 준 / 29분 49초, // 사물을 그려 / 생각이 가는 길을 연다.” 시를 읽어보니 ‘사물을 그려 생각이 가는 길을 연다’는 대목이 참 좋다. 덕분에 보지 않은 작품임에도 마치 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