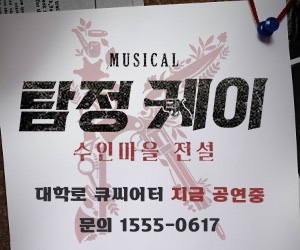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첫 번째 과제로 ‘노인 맞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실현의 첫 번째 과제로 ‘노인 맞춤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커뮤니티케어의 골자는 노인 및 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재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집에서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당연한 말이지만 집에서 의료 및 돌봄 행위가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우선 집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리치료를 예로 들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집에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으려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커뮤니티케어에서 방문의료, 즉 왕진은 필수 항목이지만 현재로서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응급환자 발생 등 예외가 허용되지만 턱없이 낮은 의료수가 때문에 많은 의료진이 꺼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수가 신설 등 방안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대체로 의사 한 명이 온종일 환자를 보는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해결돼도 ‘인력’의 질이 떨어지면 커뮤니티케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인력의 질은 실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마인드까지 포함한다. 이 정책의 핵심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방문의사는 일반적인 개원의와 달라야 한다. 환자 상태를 가장 먼저 보고, 다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그 무게감이 다르다. ‘재택의료’를 필요로하는 사람에겐 방문의사가 전부인 셈이기 때문이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상황에서 환자는 진료도 필요하고, 말벗도 필요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건강정보도 필요하다. 혹여 의사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환자가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커뮤니티케어가 추구하는 모습은 단순히 ‘재택의료가 가능한’ 환경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가 공감하고, 몸은 물론 마음까지 함께 치료해 나가는 것이 방문의사의 모습일 것이다.
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제주 요양원에서 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만약 요양보호사와 환자만 있는 공간에서 폭행이 일어났더라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대상으로 간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 기업의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재 시스템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에 적합한 마인드를 가진 인력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돌봄 서비스는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서비스업’이라고. 빠른 정책 시행도 중요하지만 커뮤니티케어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행위를 제공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