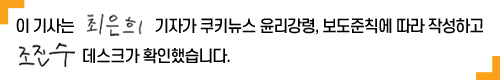‘여의도 고구말’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와 고구마, 말의 합성어로 답답한 현실 정치를 풀어보려는 코너입니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매일 내뱉는 말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발언 속에 담긴 의미를 독자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향한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실은 한일 간 협치가 핵심이라며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1 만세운동으로부터) 104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 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이 반복되게 될 것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극우 꼴통”, “매국노 이완용” 등 원색적인 성토가 쏟아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일제의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것을 두고도 “청산되지 않은 과거사에 대한 해법은 어디에도 없는데, 이 사실을 윤석열 정부만 필사적으로 모른 척한다”며 “결국 기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대(對)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독립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부정하는 3·1절 기념사에 대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교수도 가세했다. 그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주위에 극우꼴통들만 있으니 이게 신호탄”이라며 “그 뒤로 위안부, 징용공, 오염수, 일본 정부의 군국주의 미화 등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마음의 준비들 하시라”고 적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표하며 반박했다.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일 간 협력을 강조한 것이 기념사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는 늘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지 않으냐. 모든 게 함께 얽혀 있는데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비판에 정략적 의도가 숨어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거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 있다”며 “과연 어느 쪽이 좀 더 국가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엄호에 나섰다. 그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라고 일갈했다.
1998년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밝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계승자라고도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일본 수상이 1998년 선언한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다.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더 이상 첨삭이 필요치 않은 한일관계의 이정표”라며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문화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일본 문화 개방을 단행했고, 가장 큰 덕을 본 것은 우리”라고 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언론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파트너’라는 대목에 대해 “우리는 이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라며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일본과 더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역대 정부의 대일 메시지와 차별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을 견제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명확히 규정했다”며 “일본이 오랫동안 호소해온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중심을 옮기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