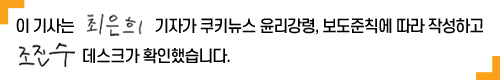선거철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세대 용퇴론’이 되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들을 이어갈 만한 정치적 후계자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86그룹’은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를 칭한다. 민주당 86세대는 2000년 16대 총선을 기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총재를 맡고 있던 새천년민주당은 우상호·이인영·임종석 등 전대협 출신을 대거 영입했다. ‘젊은 피 수혈론’에 힘입어 금배지를 단 이들은 요직을 독점하며 몸집을 키워갔다. 여러 계파들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86세대만은 당내 주축으로서 자리를 지켰다. 30대 86세대를 지칭하는 386에서 시작해 486, 586을 거쳐 어느덧 686 초입에 들어섰다. ‘86세대 용퇴론’이 매번 분출하는 배경이다.
86그룹 용퇴론은 당이 위기에 직면한 경우나 선거철 등 ‘당 쇄신’이 화두로 떠오를 때마다 등장했다. 한때 김종민 의원, 송영길 전 대표가 불을 지피기도 했다. 86세대 다선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용퇴론의 핵심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지난해 민주당이 대선과 지선에서 잇따라 패배한 후 86용퇴론은 자취를 감췄다. 청년 정치인들의 외침도 메아리에 그쳤다.
지난 2015년 30대 이동학 청년 혁신위원은 ‘86그룹 맏형’인 이인영 의원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86세대의 퇴장을 촉구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당 지도부와 충돌한 뒤 물러섰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이뤄진 ‘공천 물갈이’도 86그룹 교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86세대 용퇴론은 매번 “대안이 없다”는 한탄과 함께 용두사미로 끝났다. 여기엔 후배 세대가 세력·역량 면에서 새로운 당의 간판이 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깔려 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는 “86세대를 밀어내기 위해선 청년 세대들이 그들의 정치적 주체성과 연대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시대에 맞는 역량과 리더십을 챙겨 민심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 86세대 탓만 한다면 이는 마녀사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86세대에 쓴소리를 날렸던 이동학 민주당 전 청년 혁신위원도 “‘노장청(노년·장년·청년)’이 조화롭게 구성된 당이 돼야 한다. 현 민주당은 특정 세대가 과도하게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서도 “청년 세대들도 86세대 핑계만 대는 것이 아니라 걸맞는 역량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지부진한 혁신으로 인해 86세대가 또다시 민주당을 이끌면서, 마땅한 정치적 후계자를 키워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 여당 관계자는 “내년 총선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민주당 주류 세력인 86세대가 이끄는 마지막 선거에 가깝다”라며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운동권 이념으로 등을 맞대온 86세대를 밀어내고 타석에 설 ‘다음 타자’가 없다는 점이다. 86세대가 하나둘씩 은퇴하고 나면 당 자체의 지형이 흔들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반된 평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위기 때마다 기사회생했고 보수당을 앞선 적도 많다. 지금은 후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시대가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