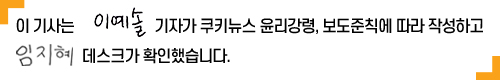“축의금으로 10만원을 냅니다. 5만원도 사실 힘들어요. 하지만 높은 식대, 신랑·신부와의 관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어요.”
차모(29·회사원)씨는 매달 경조사비로 20~60만원을 쓴다. 치솟은 물가에 생활비 쓰기도 빡빡한데 급여의 약 30%가 경조사비로 나가니 부담이다. 그는 “누가 됐든 (친밀도와 무관하게) 축의금으로 10만원 이상은 해야 하는 시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물가·고금리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을 피해 갈 수 없다. ‘축의금 플레이션’ ‘청첩장 고지서’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고민하는 이가 많은 게 현실이다. 결혼의 계절 가을, 주변에서 들려오는 결혼 소식에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는 유독 부담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가 물러나고 결혼식은 느는데, 물가 상승에 식대까지 치솟았다. 바뀌지 않은 건 빠듯한 지갑 사정이다.
호텔 예식장을 시작으로 식대가 오르면서 기본 5만원 하던 암묵적 축의금 룰도 깨진 상황이다. 서울 지역의 웨딩홀 식대는 6만~8만원 정도다. 서울 강남권 예식장은 기본 식대가 8만~10만원대로 올랐다. 결혼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관료, 꽃값 등 부수적인 결혼 비용도 일제히 치솟았다.
청년 상당수는 축의금 액수를 정할 때 식대 등 예식 비용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조모(26·회사원)씨는 “친하지도 않은 지인이 5만원 내고 가족까지 데려와 식사하면 큰 비용을 들여 결혼을 준비한 부부 입장에선 서운할 것 같다”며 “친하지 않더라도 식대보다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축의금 부담에 계좌로 돈만 보내고 예식에 참석하지 않는 ‘노쇼’도 생겼다. 온라인에서 5만원과 10만원을 두고 적정 축의금 논쟁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선 ‘밥 먹으면 10만원, 참석하지 않으면 5만원’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취업준비생 김민영(25)씨는 최근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대학 선배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다. 그는 “5만원과 10만원 사이에서 고민했는데, 수입이 없어 결혼식에 가지 않고 적게 내는 것을 택했다”며 “식대가 5만원을 훌쩍 넘는데 밥까지 먹고 오긴 민망했다”고 말했다. 기본 축의금에 대한 암묵적인 분위기가 10만원 이상으로 올랐지만, 수입이 없으니 고민스럽다는 얘기다.
청첩장을 전달하는 신랑·신부도 지인들의 반응을 모를 리 없으니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오는 12월 예식을 앞둔 A씨는 “식대는 비싸지고 결혼 준비 비용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다”며 “요금 식대가 5만원은 훌쩍 넘어 그 금액 아래 축의금은 손해다. 식대가 비싸지면서 축의금 부담에 하객이 적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9월 결혼 예정인 김재혁(34)씨는 “서울 기준 웨딩홀 식대가 7만원 이상이더라”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결혼식 초대를 하면서 축의금 액수 고민 없이 참석해달라고 당부할 생각”이라며 축의금 부담으로 지인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전문가는 끊이지 않는 축의금 논쟁에 대해 ‘과연 축의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축의금 문화는 자발적 상호부조의 성격으로, 품앗이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비혼·만혼이 확산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청년 세대가 축의금 문화의 당사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축의금 적정 금액 논쟁의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과연 현금 축의가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잠재돼 있다”며 “축의금 적정 금액 논쟁이 결국 축의금을 현금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일지 논의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가 근대화되고 제도화되면서, 결혼 축의금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도 제도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