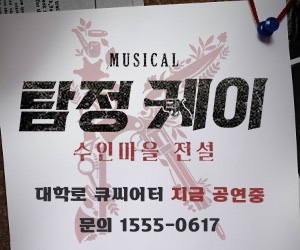초저가를 무기로 한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직구 플랫폼의 공세가 매섭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시장 침투율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플랫폼을 견제하는 가운데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에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은 파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의 지난달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17만명으로 1년 사이 두 배가 늘었다.
알리에 이어 테무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테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올해 1월 45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8월(33만명) 대비 1261%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 테무와 알리의 MAU를 합치면 1000만명이 넘는다.
아직 쿠팡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알리와 테무가 국내에서 인기를 끄는 이유는 국내 쇼핑앱 상품에 비해 다양한 제품군을 ‘박리다매’식으로 저렴하게 팔기 때문이다. 또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것도 있다.
중국 플랫폼이 확산하면 국내 이커머스 시장 위축은 물론, 입주 중소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통관이나 인증 등 국내 거래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인력이나 추가 비용 등이 발생한다. 결국 시작점에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중국발 직구는 이런 부분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사실상 매출 저하가 우려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플랫폼을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내 업체들이 가품을 판매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통관 절차 외 별다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중국 직구 플랫폼의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짝퉁 이슈, 품질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맞지만 일단 제품의 신뢰도나 배송 문제 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SSG닷컴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 플랫폼의 공습으로 자칫 국내 유통산업 기반이 위협받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국내 업체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는 반면 중국 플랫폼은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역차별’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계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다는 방침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