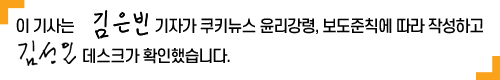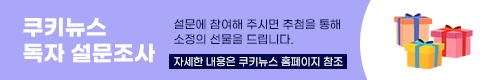최근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했음에도 한국 출시를 꺼리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환자들이 효과 좋은 약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건강보험 재정과 치료 접근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약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강선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 ‘의약품 ‘코리아 패싱’ 대응 방안’ 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종혁 중앙대 약대 교수는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신약이 개발되고 시판되며 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해외에서 쓰는 신약이 한국에 도입되는 비율이 적을 뿐 아니라 시판되더라도 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미국제약협회(PhRMA)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시된 뒤 한국에 1년 안에 진입하는 신약은 5%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8%에 비해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항암제, 희귀의약품 도입은 더욱 힘겹다. 한국은 미국에서 최초 허가된 항암제, 희귀의약품을 도입하는 데 평균 27~30개월이 걸린다. 독일(9~15개월), 영국(12~15개월), 캐나다(15~18개월)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더딘 수준이다.
신약 허가율과 급여율도 주요 20개국(G20)과 OECD 회원국들과 차이가 크다. 미국제약협회에 따르면 G20, OECD 회원국의 평균 신약 허가율은 각각 38%, 41%였다. 반면 한국은 33%에 그쳤다. 평균 신약 급여율 역시 G20(28%), OECD(29%)에 비해 한국은 22%로 떨어진다.
그 원인으론 해외보다 낮은 한국의 약값이 꼽힌다. 캐나다 정부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평균 약값과 비교해 한국은 62% 수준에 불과했다. 이 교수는 “미국제약협회의 ‘신약 최초 허가 후 시판 급여 속도 비교’ 자료를 보면, OECD 평균(45개월)과 한국(46개월)의 차이가 크지 않다. 급여 속도가 느리지만은 않다는 것”이라며 “‘코리아 패싱’의 원인을 급여 속도에서 찾기보다 해외에 비해 약값이 낮다는 점 등을 다각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해 의약품 가격을 낮게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시장 규모가 큰 중국이 한국 약가를 참고해 유통 가격을 정하는 등 해외에서 한국의 신약 가격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먼저 신약 가격을 낮게 책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이를 근거로 약값을 더 낮추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제약사가 한국 시장 진출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들의 부담 측면에선 약값이 낮을수록 좋지만 ‘코리아 패싱’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신약 접근성과 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