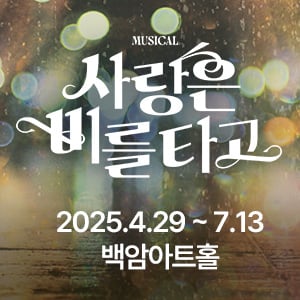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이 1.9%로 조정됐다. 실질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OECD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한 2%에서 0.1%포인트(p)를 낮춘 것이다.
잠재성장률이란 잠재GDP의 성장률을 말한다. 노동력과 자본,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총생산(GDP)의 성장률로, 물가 상승 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측정한 값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으로는 고령화 등 노동력 감소가 꼽힌다.
한은도 지난해 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5~2029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그 원인을 “혁신이 부족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라 투자가 둔화하며 노동과 자본 투입 기여도도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1.9%)은 주요국인 G7과 비교하면 미국(2.1%)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나머지 국가의 잠재성장률은 캐나다 1.7%, 이탈리아 1.3%, 영국 1.2%, 프랑스 1.0%, 독일 0.5%, 일본 0.2%로 한국보다 낮았다.
실제로는 전망된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전망한 올해 실질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았다. 한국의 실질GDP 성장률은 1.0%로 잠재성장률 1.9%를 0.9%p 밑돌았다.
올해 실질GDP 전망치를 잠재GDP 전망치와 비교한 값인 GDP갭률을 보면, 한국은 –1.1%로 실질GDP보다 잠재GDP가 높은 경기 둔화 상태다. 독일(-1.4%)보다 낮고 캐나다(-1%), 프랑스(-0.8%), 일본(-0.2%), 영국(-0.6%), 미국(+0.5%) 등 나머지 국가보다는 경기가 더 침체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앞서 성장률을 개선하려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 개선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업투자 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수도권 집중 완화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과 고령층의 생산성 제고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