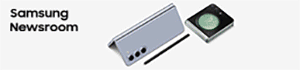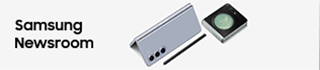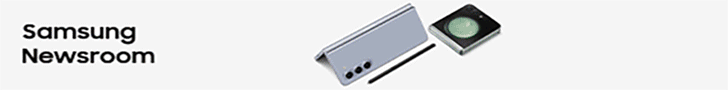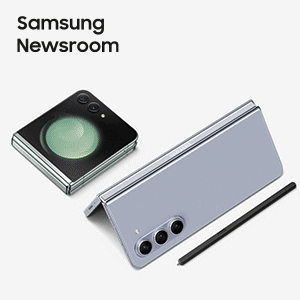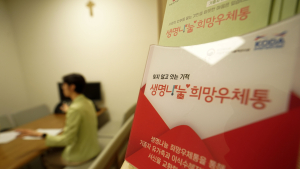인도는 막판까지 우리측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치과대학만 180곳 이상, 치과대 연간 입학생 수가 1만3000여명이다. 반면 한국은 11개 대학, 760명으로 인도의 6% 수준이다. 양국간 인구 차이를 감안하면 큰 격차는 아니지만 미국 등 해외로 의료진을 대량 ‘수출’하고 있는 인도의 비교우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인도측은 한국에서 외과의사나 응급실 간호사 등에 대한 기피현상이 있다는 시장조사 결과도 갖고 있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도 치과의사하면 10명 중 8명이 인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 “많은 의료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인도측이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의료 인력시장 개방은 국민의 보건에 직결되고 국내 이해당사자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문제임을 설득, 결국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농산물 협상은 의외로 수월했다. 양국 모두 농산물 관세 인하 자체가 민감한 이슈여서 상당부분 개방을 꺼렸기 때문이다. 외교부의 다른 관계자는 “각자 농산물시장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거의 대부분 손대지 않았다”며 “다만 우리측이 공산품 관세 추가 인하를 요구하자 카레의 원료인 강황과 망고의 관세 인하를 제시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인도인 영어교사 진출 요구도 영어보조교사로 절충됐다. 인도는 힌디어를 포함 공용언어가 18개에 달한다. 자국민간에도 의사소통이 힘들어 공공기관에서도 영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때문에 영어 구사가 자유로운 자국민을 영어교사로 받아줄 것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원어민이 아닐 경우 보조교사로 쓴다는 국내규정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