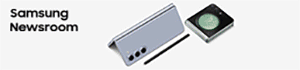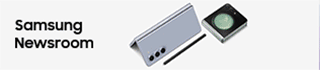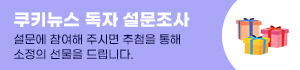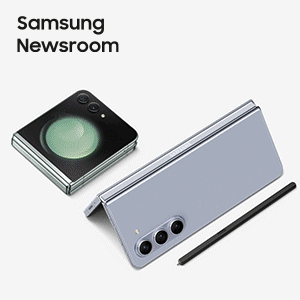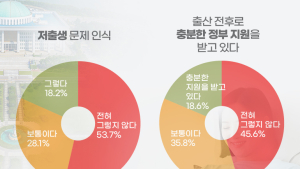[쿠키 문화]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가 화제다. 패션 기업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건실한 디자이너 지망생이 현실에 부딪히고, 좌절한 후 ‘속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이 드라마는, 의외로 현실적이다. 명품과 사치품이 진정한 가치라고 어필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무시당하고 넘어지는 ‘서민’. 사모님 심부름이나 하는 디자이너와, 5만원짜리 부츠는 ‘후졌다’고 비난하는 디자인 실장.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며 진짜로 존재할까 의문이 드는 그곳은, 슬프게도 이미 현실이다.
국내 굴지의 패션기업에 입사해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해 왔던 J씨는, “‘청담동 앨리스’라는 제목을 듣고 바로 납득했다.”고 말했다. “거기는 정말로 ‘이상한 나라’예요. 앨리스들이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라며.
J씨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아침 여섯시에 일어났다. 여덟시까지 강남에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서다. 원래 출근 시간은 아침 아홉시지만, 디자인실 막내인 J씨에게 아홉시라는 출근 시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회사에 가자마자 디자인실 청소부터 한다. 드라마에 나오는 고상한 디자인실 같은 건 우습기만 하다. 들썩이면 먼지만 이만큼 풍기는 소재 샘플들, 디자인 플랫(Flat)화 따위가 지저분하게 나뒹구는 디자인실은 온전히 J씨의 몫이다.
청소는 시작일 뿐이다. 출근한 선배들 자리 챙기랴, 부장님 커피 타 놓으랴. 앉을 새가 없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J씨에게 가뜩이나 불편한 구두는 발목을 아리게 한다. 40대의 ‘골드미스’부장님은, 운동화를 제일 싫어한다. 패션계 여자에게 하이힐을 떼 놓는 것이 말이나 되냐는 부장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장님이었던 것만 같다. 디자인실 잡무도, 옆에 붙은 소재실 잡무도 모두 5센티미터 굽의 구두를 신은 아르바이트 J씨의 몫이다.
잡무를 하다 말고 종종 디자이너들에게 불려가기도 한다. 새로 나온 샘플 의류나 가봉 중인 의류의 ‘피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선배들은 제작 중인 의류의 합을 J씨를 세워 놓고 맞춰보곤 한다. J씨는 선배들의 샘플 비교가 끝날 때까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제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 멀쩡한 피팅 마네킹을 옆에 두고도 말이다. 그래도 J씨는, 자신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말한다. “의류 회사들 막내들은 기본적으로 키는 163 이상, 신체 사이즈는 44에서 55여야 해요.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학벌이 아무리 좋고 포트폴리오가 좋아도 면접에서 튕기기 일쑤예요. 피팅을 해야 하니까요. 제 신체 사이즈는 우리 회사 조건에 맞았죠.”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며 3년, J씨의 소속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안목이 후지다’며 문근영을 비난한 실장 또한 의외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 유형이라고 했다. J씨의 연봉은 3년동안 세전 140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연봉 14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명품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종종 그녀의 선배들은 노골적으로 J씨가 입고 걸친 옷의 출처를 묻고는 했다. 대놓고 좋은 옷 입는 게 어떠냐고 권하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어머~ 보세야?”“젊으니까 그런 것도 입지.”등의 말은 J씨를 음습하게 괴롭혔다.
“회사 패밀리세일에서 저렴하게 구입하면 어때?”라는 말에 들여다 본 패밀리 세일의 코트 가격은, 세일품인데도 J씨의 한 달 생활비를 훌쩍 넘어갔다. 그녀의 선배들도 연봉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저 ‘집안’이 달랐을 뿐이다. 얼마 되지 않는 연봉은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그 연봉을 받으면서도 사치품을 살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좋은 물건을 입고 써봐야 좋은 걸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물론 맞는 말이었지만 J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명품 브랜드의 사장이면서도 노골적으로 ‘속물’들을 비난하는 박시후. 이리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그 브랜드에서 기어이 성공하고 말겠다는 문근영을, J씨는 슬프게도 너무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꿈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환경이거든요. 예쁜 걸 만들기 위해 배운 미학과, 매일 볼 수 있는 예쁜 것들 때문이에요. 너무나 힘들지만, 나중에 저런 고급 브랜드를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소비하고 싶다는 욕망이 저를 그만둘 수 없게 했어요.” 대체 누가 그녀를 비난할 수 있을까.
소위 유학파, 유학파가 아니라면 SKY출신, 집안까지 가려 뽑는다는 ‘이상한 나라’는 사람을 주눅들게 했다. 주눅들어 있는 사람이 회사에서 멀쩡히 자랄 수 있을 리 없다. 3년 사이에 그녀는 이리저리 꼬부라져 자란 콩나물같이 변했다, 선택은 결국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J씨도 알고 있었다. 회사를 나오거나, 몇 년을 더 지독히 버텨 선배들같이 되거나.
“그래도 제 경우는 약과예요. 아득바득 몇 년을 버텨 올라갔던 모 브랜드의 어떤 실장님은 고생 끝에 결혼하나 했더니 결국 파혼했다고 들었어요. 왜냐고요? 결혼 전에 몇 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사치품을 무리해 사느라 결국 사채 빚만 몇 억을 진 것이 들통 났거든요. 그렇다고 그녀가 허영이 가득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결국 그런 삶을 알게 모르게 강요한 그곳이 문제였죠.”
물론 패션 기업들이 꼭 ‘이상한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견실하고 탄탄한, 바람직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도 많다. 그러나 그녀가 바랬고, 지원서를 써 냈던 ‘하이 패션’에 가까운 곳들은, 대부분 그랬다. 결국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다른 회사에서 생판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
“‘공포감’을 판다는 박시후의 말이 극 초반에 나오잖아요. 저는 ‘공포감’을 강매당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정도 못 하면, 너는 브랜드를 디자인할 자격이 없다는 공포감이요.”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은지 기자 rickonbge@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