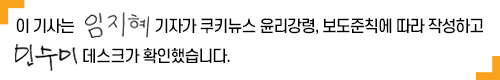[0.687]
글로벌 성 평등 지수 0.687. 156개국 중 102위. 한국은 완전한 평등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다. 기울고 막힌 이곳에서도 여성은 쓴다. 자신만의 서사를.

“지은씨, 둘째 계획은 없어?”
이지은(34)씨는 출산·육아휴직 복귀 전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해 오랜만에 회사에 나갔다. 출산 전 직장에서 꽤 능력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았다. 일이 즐거웠고, 자부심도 컸다. 업무를 떠난 지 1년여만이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닌 이지은으로 직장에 돌아가는 것 말이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은 오랜만에 만난 이씨에게 둘째 계획을 물었다. 주말부부로 직장 다니며 애 하나 키우는 것도 버겁다고 애써 웃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첫째 키울 때) 같이 키우는 게 편하다더라”
“주변에 둘, 셋 낳아 기르는 친구들 보면 외동은 외로워 보여”
한 명 키우기도 힘든데 둘은 편하다니. 이건 무슨 말일까. 동생의 존재 이유는 형제의 외로움을 감당하기 위해서인가. 이씨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나지 않았다. 사생활인 가족 계획을 묻는 것도 불쾌했지만, 각자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은 배려 없는 말이 상처로 남았다.

아이는 예쁘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건 힘들다. 엄마는 경력단절 기로에 선다. 아빠는 돈 버는 노예가 된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부부 모두 출산 전보다 삶이 팍팍해졌다는데 공감할 것이다.
세 아이를 둔 나 역시 그랬다. 입덧 시기엔 취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링거를 맞아야 했다. 온몸이 뒤틀리던 출산의 고통은 잊히지 않는다. 밤새 신생아의 눈물 폭탄을 때려 맞았다. 물론 잠은 못 잤다.
‘크면 여유가 생기겠지’ 했던 기대는 현실과 달랐다. 툭하면 싸우는 아이들을 뜯어 말려야 했다. 학교·학원·친구 관계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에는 매년 복리가 붙었다.
가족 수 만큼 나갈 돈도 늘었다. 다들 다자녀 혜택이 부럽다고 노래하지만, 우리 가정이 받는 혜택이라곤 매달 1만원대 전기세 감면이 전부다. 집안일로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싫어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아이들 키와 우리 부부 흰머리는 동시에 자랐다.
둘을 낳아도, 셋을 낳아도 세상은 여성의 몸에 간섭하고 참견할 것이다. 실제 딸 셋인 우리 가족에 막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몇몇 지인들은 “넷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란 소리를 했다.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단 1시간이라도 육아를 대신해 준 적도, 과자 한 봉지 사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말이다.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지난 2010년에 개봉한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아이를 낳는 건 얼굴에 문신하는 것과 같아. 한 번 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거든. 그러니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돼” 부모가 되어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건 이런 것이다.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섰을 때 비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육아에 어떠한 지분도 없는 이들의 “둘째 안 가져?”란 질문은 오지랖일 뿐이다. 여기에 타인이 낄 자리는 없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