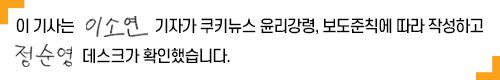정부에서 통신시장 경쟁 강화를 위한 두 가지 축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과 알뜰폰 강화를 내놨다. 다만 제4이동통신사 설립 효과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나머지 한 축인 알뜰폰이 경쟁강화를 이뤄나갈 수 있을까.
지난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통신시장의 과점 상황과 제4이동통신사 도입 효과 등에 대해 학계·소비자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제4이동통신 설립이 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요금이나 서비스에 있어 실질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기에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장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이동통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1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을 감소시켰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한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요금 수준이 10.7~12.4% 낮았다”고 설명했다.
큰 변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통신시장은 포화 시장이다. 인구는 줄고 있다. 새로운 설비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한다고 해서 가격이 낮아질지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싶어 하는지, 추가 사업자가 들어와도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지 등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며 신중론에 표를 던졌다.
실제로 제4이동통신사 등장은 갈 길이 멀다. 앞서 정부는 7번이나 새로운 사업자를 찾았으나 모두 불발됐다. 정부는 연내 신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지만 기업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막대한 초기 비용에 비해 큰 수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대안은 없을까. 이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서비스경쟁의 한 축인 알뜰폰 사업자가 저가·소규모 통신사가 아닌 규모의 경제를 갖춰 통신 3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의 몸집을 키우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려 이용자에게 자체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재판매 서비스다. 일반 통신망보다 절반가량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다. 국내에는 지난 2011년부터 도입됐다.
무선통신 서비스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수는 3069만명으로 점유율 39.9%다. KT 22.9%(1756만명), LG유플러스 20.8%(1595만명), 알뜰폰 16%(1264만명)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도입 이후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 1년 사이 200만명 이상 늘어났다. 통신 3사는 모두 합쳐 같은 기간 160만여명 늘어났다. 가계 통신비 부담 등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알뜰폰에 가입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시장에 규모 있는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알뜰폰 업체 ‘KB리브엠’을 설립했다. 통신과 금융을 결합해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토스를 운영하는 핀테크 기업 비바리퍼블리카도 토스모바일을 설립, 알뜰폰 시장에 참전했다. 24시간 고객센터와 확충된 멤버십 등으로 고객을 모으고 있다.
다만 한계도 있다. 기존 이동통신사로부터 망을 빌리는 구조이기에 새로운 요금제 설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망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돼 국회에서 재논의가 진행 중이다. 의무제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일몰 기한이 지난 뒤에 다시 법이 제정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7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진짜 일몰되면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쓰기 어려워진다. 알뜰폰 업계가 말라 죽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면서 “요금제를 새롭게 제안해도 통신사와의 협의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견제를 받는다. 중간 요금제를 먼저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 오는 10일에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