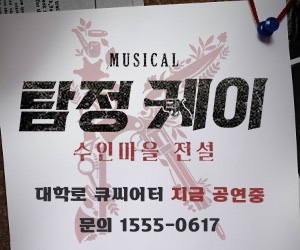유해물질 유출로 피해가 우려되자 근무를 중단한 채 작업장 근로자들을 대피시킨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회사를 상대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A씨에 대해 원고패소 판단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세종시 한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7월26일 오전 9시쯤 회사로부터 약 200m 떨어진 한 공장에서 화학물질인 티오비스가 누출됐다는 사고 소식을 들었다. 티오비스는 공기 중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로 변질돼 인체에 유해하다.
현장 소방본부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50m 거리까지 대피하라’고 방송했다. 아울러 반경 500m∼1㎞ 거리의 마을 주민들에게도 창문을 폐쇄하고 외부 출입을 자제하도록 이장들을 통해 안내했다.
당시 회사의 노동조합 지회장이던 A씨는 소방본부에 전화해 상황을 파악한 뒤 작업 중단을 지시하고 조합원 28명과 함께 대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52조 1항은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사고 이틀 후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A씨가 조합원들과 함께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2017년 3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작업중지권 행사의 요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누출 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00m 거리에 있던 작업장이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는 소방본부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대피하면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