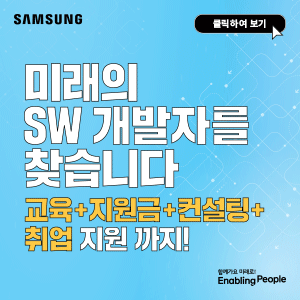자영업자의 줄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변화의 시점이 다가온다.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시행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채무자가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공적 영역에서 존재하던 채무조정을 사적 영역으로 확대해 좀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여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금융사의 대출금 회수나 채권을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체이자도 부과하지 못 하도록 제한한다. 또 대출금 회수와 관련해 1주일에 최대 7회로 독촉을 제한하는 등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도 높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채무자 보호에 나선 것은 채무자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져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한 구성원을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 속에 일자리와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 보다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사회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이지만 시행을 앞두고 우려도 높다. 일단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려워지고, 채권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아 걱정이 한가득하다. 여신업권에서는 “10월 전까지 보유한 채권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장기적으로 보면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가 빚을 꾸준히 갚아나갈 경우 금융사에도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3개월 단위로 실적을 평가받는 금융사에는 너무 먼 이야기다. 채무조정을 두고 ‘도덕적 해이’ 우려도 여전하다.
채무자보호법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채권자는 장기적 이익을 고려해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이라는 혜택을 받는 만큼 빚을 성실히 상환해 재기에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합의가 나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점점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에 빚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