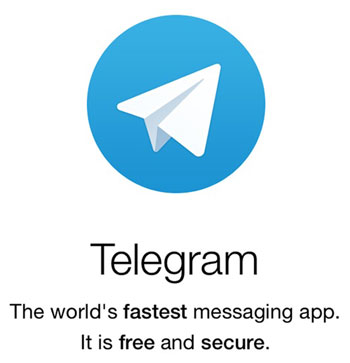
최근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에 나서는 한국 사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러시아의 마크 저커버그’라 불리는 바벨 두로프가 만든 이 메신저가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떠오르자 유독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암호화’ 정책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이유로 보려하다 해도 대화 내용이 유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텔레그램이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이유는 ‘국가 감시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7일 연합뉴스는 마커스 라 텔레그램 언론·지원 부문장이 이메일 인터뷰에서 “2011년 러시아의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때 텔레그램 개발팀은 러시아에 살고 있었다”며 “당시 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는 어떤 소통 수단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개발팀은 데이터 암호화 프로토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러시아를 떠나 유럽으로 건너간 뒤 텔레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시대에 필수 서비스가 된 모바일 메신저에 있어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중시되는 건 특정 업체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6일 페이스북에 190억 달러(약 20조2천억원)에 인수가 완료된 미국산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경우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페이스북에 인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미국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점 역시 와츠앱의 공동 창립자인 잰 쿰이 유년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면서 ‘국가의 감시’에 민감하게 자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쿰의 부모는 도청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집에선 절대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인수 발표 당시 포브스는 전했다.
김현섭 기자






































